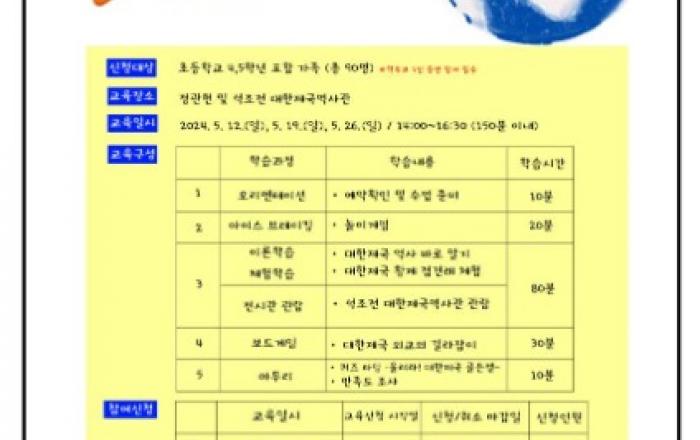같음이 만든 다름

생명의 시작,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담다 - 보물 제1055호 백자 태항아리 ⓒ호림박물관
아이와 엄마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해줬던 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분신이자 생명의 근원을 상징한다. 그렇기때문에 태는 신성했던 것이다. 고려시대 과거시험 과목 중 하나였던 <태장경(胎藏經)>에서는 “사람이 현명할지 어리석을지, 잘 될지 못 될지가 모두 탯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라고 기록했다. 태에는 곧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었으며, 왕실에서는 국운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태항아리를 따로 만들어 전국의 명산을 찾아 묻었다. 왕손의 태는 항아리에 담아 3일간 달빛에 씻고 물로 백여 번을 닦아낼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 조선시대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중류층 이상의 가정에서도 태를 귀히 여기는 풍속이 존재했다. 태를 불에 태우거나 말려 항아리에 담아 묻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비해 강물에 흘려보냈다.
보물 제1055호 백자 태항아리는 그중에서도 곡선미가 도드라진다. 단정하면서도 풍만한 자태와 은은한 광택이 생명의 신비를 담는 항아리답다. 태를 소중히 여겼던 모든 풍습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조상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반려자와 걷는 신행길, 축복을 새기다 - 액을 쫓고 신랑 신부의 만복을 기원하는 ‘사인교’ ⓒ토픽이미지
시집가는 날, 흔들리는 꽃가마 안에서 신부는 설렘과 함께 떠남의 아쉬움이 교차했을 것이다. 네 사람이 앞뒤로 들었다 하여 사인교(四人轎)라 불리는 가마는 혼례 때 사용됐다. 신랑이 말을 타기도 했으나, 신랑 신부 모두 가마를 타 는 경우도 있었다. 꽃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신부의 사인교는 덮개 사면 둘레에 오색 술을 둘렀으며, 몸체에 부부 금실과 다산을 기원하는 무늬를 새겨 넣었다. 새와 매화, 복숭아, 용과 호랑이, 봉황 등의 문양을 4면 전체에 투각했다.
옆 미닫이 유리창에는 꽃을 그려 넣었고, 들창문과 양쪽 문밖에는 칠보무늬와 거북등무늬를 새겨 신부의 앞날이 길하기를 염원했다. 사인교는 창문과 주렴, 수식(드리개) 등으로 겹겹이 에워싸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마가 움직일 때마다 주렴과 수식이 부딪혀 장고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이 역시 액막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인교 위에도 나쁜 액의 접근을 막기 위해 호피를 덮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마 안 방석 밑에는 액을 쫓는 숯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목화씨를 놓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 행복한 꽃길만이 펼쳐졌으면 하는 선조들의 배려와 진심이 사인교 곳곳에 세심히 담겨 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칠, 출셋길이 열리다 - 장원 급제의 상징 ‘어사화’ ⓒ국립민속박물관
과거시험에서 장원하는 일은 가문의 영광이자 고을의 자랑이요, 부모를 향한 큰 효(孝)라고 여겨졌다. 평범한 선비들은 출세의 유일한 동아줄로 과거를 기다렸고, 조선 팔도의 내로라하는 인재는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섰다. 입신양명을 위해 선조들은 과거시험에 일생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과거에 급제한 사람은 합격증과 함께, 임금이 내린 어사화를 받고 축하 행진을 벌인다. 3~5일 동안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다. 행진 중, 지나치게 술을 많이 들어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는 폐단 때문에 중단이 건의된 바도 있었다.
왕이 장원 급제한 사람을 대궐로 불러 손수 오색종이로 만든 꽃을 꽂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꽃을‘어사화(御史花)’라 했다. 일명 모화(帽花)·사화(賜花)라고도 불렸다. 120cm 정도 되는 2개의 대나무 가지에 문방사우 중 하나인 종이로 국화 모양을 만들어 홍색, 황색, 청색 순으로 보기 좋게 붙이고, 과거 급제자가 쓰는 관(冠)인 복두에 꽂았다.
한편, 어사화는 임금이 베푸는 잔치 때 신하들이 임금이 내린 꽃을 사모(紗帽)에 꽂고 돌아다니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어사화라고 불렀다. 이를 은화(恩花)라고도 했는데 임금의 은덕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산 자와 죽은 자, 그 모두를 치유하다 -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연합콘텐츠
인생의 과정을 매듭짓기 위해 우리는 예외 없이 죽음이란 관문 앞에 서게 된다.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전통예술로 풀어낸 진도씻김굿은 ‘씻김’이란 행위를 통해 망자의 한(恨)을 풀어주는 치유와 위로의 의식이다.
굿의 전반부는 집안의 우환을 제거하고 가족의 복락을 기원하는 굿거리로 구성됐다면 중반부는 모두 망자와 관련되어 있다. 긴 무명베를 일곱 매듭으로 지어 기둥에 맨 다음 그것을 잡고 푸는 ‘고풀이’는 죽은 자가 이승에서 풀지 못 한 원한을 상징한다. 고를 잘 풀어냈다면 다음은 굿 전체의 이름이 된 씻김 순서다. 정화수와 쑥물, 향물을 빗자루에 적셔 망자의 육신을 대신하는 영돈을 씻겨 내려간다. 망자의 넋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저승길을 닦는 길닦음까지 하고 나면 굿청에 모여든 잡귀와 잡신을 달래 보내는 배송굿으로 마무리 짓는다. 죽은 이의 영혼이 이승을 떠돌면 해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도씻김굿은 산 사람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죽음을 지척에 두고 펼쳐지는 단아하고 절제된 무녀의 춤사위, 망자와 산 자의 영혼에 머물 아름다운 가락이 진도씻김굿을 전통 의식을 넘어 예술적 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킨다. 출처 문화재청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